직장인이자 아내와 아들을 둔 가장인 김종국씨(가명)는 요즘 들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게 두렵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휘발유 값 때문이다. 그나마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로 리터당 1600원대를 지하곤 있지만, 지난해 비슷한 시기와 견줘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1년 전엔 리터당 1200~1300원대에 불과했다.
한동안 저유가가 유지될 거란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에 값비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대신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 같아 후회 중이다. 20만원 안팎을 쓰던 월 유류비가 지금은 25만원대로 치솟았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있기 전인 한 달 전엔 상황이 더 나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11.7~11)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7.4원 오른 L(리터)당 1807.0원으로 집계됐다. 주간 평균 휘발유 가격이 1천800원 선을 넘어선 것은 2014년 9월 이후 7년 만이었다.
문제는 유류세 인하 조치의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국제유가는 지난 10월 7년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어서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언제든 리터당 1800원대로 회귀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평균 2000원을 넘어섰던 지난 2012년 상반기 악몽까지 소환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국제적으로 원유 공급 부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유가 상승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유가는 일반 가정의 생활비, 기업의 생산비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어서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화물업계 등 자동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계층에게는 휘발유 가격 인상은 직격탄이 될 수 있다. 그나마 휘발유는 있어서라도 다행이다.

김씨가 업무용으로 타고 다니는 법인 명의 트럭은 이달 들어 쭉 멈춰 서있었다. ‘요소수 품귀’ 사태 때문. 요소수는 암모니아에 증류수를 섞어 만든 수용액으로, 디젤엔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에 탁월하다. 최근 출시되는 모든 디젤차엔 요소수가 필수다. 요소수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자동차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출력이 65%까지 떨어지는 등 주행에 커다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 요소수가 다 떨어져도, 공급할 방법이 없었다. 우리나라는 요소수를 만드는 요소, 암모니아를 전량 수입하고 있는데 70%의 물량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었다. 중국에서 요소 수출검사 의무화 조치를 내리면서 요소 수입길이 막혔기 때문에 급속히 부족 현상이 촉발된 것이다.
요소수를 구하기 위해 한창 주유소를 돌아다니던 김씨는 ‘요소수 없음’ 푯말만 숱하게 봐야 했다. 결국 아마존을 통해 평소 가격의 수십배에 달하는 비용을 내고 ‘직구’를 해야만 했다. 이 마저도 언제 배송 받을지 몰라 답답한 실정이다.

정부는 수급 차질을 빚은 요소수를 두고 내년 2월까지 충분한 사용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현장의 상황은 딴판이다. 전국의 요소수 재고 물량을 파악해서 구입이 가능한 거점 주유소를 산자부 홈페이지와 오피넷에 공개하고 있는데, 김씨는 갈 때마다 허탕을 쳤기 때문이다. 거점 주유소의 재고량이 하루 두 번 공개되고 있지만, 2시간의 시차로 인해 막상 가면 요소수가 다 팔리고 없을 때가 숱해서다.
김씨를 답답하게 하는 건 차뿐만이 아니다. 요샌 허기를 달래려면 지갑에서 나가는 돈의 씀씀이 훨씬 커졌다. 생활물가가 급격하게 치솟았기 때문이다. 일단 주요 외식기업들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거세다.
우리나라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대표격인 롯데리아는 12월 1일부터 제품 판매가격을 평균 4.1% 인상했다. 가격은 버거류 16종, 세트류 17종, 치킨류 12종, 디저트류 8종, 드링크류 10종 메뉴에 대해 적용되며 제품별 조정 인상 가격은 품목별 평균 200원 인상 수준이다.
대표 단품 메뉴인 불고기버거와 새우버거는 3900원에서 4100원, 세트 메뉴는 5900원에서 6200원으로 조정되며, 국내산 한우를 원료로 한 한우불고기버거는 단품 7200원에서 7500원 세트 메뉴는 8900원에서 92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경쟁사인 맥도날드는 지난 2월 총 30종 품목 가격을 100~300원씩 올렸고, 버거킹도 지난 3월 총 17종의 가격을 100~300원씩 인상한 바 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로 꼽히는 치킨도 마찬가지다. 업계 1위 교촌F&B는 최근 주요 제품 가격을 평균 8.1% 인상했다. 가격 인상에 따라 교촌오리지날과 허니오리지날이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 교촌윙과 교촌콤보가 1만7000원에서 1만9000원, 레드윙·레드콤보·허니콤보는 1만 8000원에서 2만원으로 각각 가격이 올랐다. 신화시리즈, 치즈트러플순살, 발사믹치킨 등 최근 신제품은 조정 없이 기존 가격으로 유지된다. 이외 일부 사이드 메뉴가 500원 상향 조정된다.
이제 치킨 한 마리 가격은 2만원이 됐고, 배달비를 포함하면 소비자들의 지불할 가격은 2만원이 훌쩍 넘는다. 교촌의 가격 인상은 2014년 일부 부분육(콤보, 스틱) 메뉴 가격 조정에 이어 7년 만이다. 다만 교촌치킨은 2018년 배달비 2000원을 별도로 도입하면서 사실상 가격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업계 1위인 교촌치킨의 가격 인상에 경쟁 업체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 아직까지 BBQ와 BHC 등 업체는 인상 계획을 밝히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가맹점주의 요구가 거세지면 가격 인상 단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밥상물가 어디까지 오를까
장바구니 물가는 더 심각하다. 식품가격 인상 퍼레이드는 올해 내내 이어졌다. 풀무원은 올 초 두부와 콩나물 가격을 올린 데 이어 여름이 오기 전엔 냉면, 생면, 떡류 등 가격을 평균 7~8% 인상했다. 연초 식용유 가격이 6~13% 오른 데 이어 햇반과 오뚜기밥 등 즉석밥의 가격도 7% 가량 올랐다. 동원F&B도 참치캔 22종의 가격을 평균 6.4% 인상했다. 동원참치의 가격 인상은 5년 만이다.
우윳값은 지난 10월 1일부로 올랐다. 서울우유의 인상 폭은 5.4%, 마트 기준 1리터 제품이 2500원대에서 2700원대로 올랐다. 매일, 남양유업 등도 비슷한 폭으로 가격을 올렸다. 롯데푸드는 역시 11월 1일부터 파스퇴르 우유 가격을 4.9% 올렸다.
국민들의 시름을 달래주는 주류업계 역시 가격 인상 릴레이에 동참했다. 하이네켄코리아는 의점에서 맥주 4캔을 1만원에 판매하던 것을, 1만 1000원으로 인상했다. 국산당도 쌀 막걸리 가격을 최대 25%까지 끌어올렸다.
그간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던 소주 제품도 하반기 가격을 올렸다. 대선소주가 첫 스타트를 끓었다. 대선소주 병 제품은 출고가는 1005원에서 66.8원 인상한 1071.8원으로, 시원소주병 제품은 기존 1025원에서 46.8원이 인상된 1071.8원으로 인상됐다.

증류식 소주인 화요의 가격도 전반적으로 인상된다. 화요 17도 375㎖ 제품의 가격은 6930원에서 8140원으로 1210원(17.5%) 오른다. 17도 750㎖ 제품은 1800원(13.82%) 오른 1만 5400원, 200㎖는 750원(17.85%) 4950원이 된다. 화요 25도 750㎖는 1540원(9.79%), 500㎖는 1320원(12.24%), 375㎖는 1210원(14.66%) 인상한다. 화요 53도 제품은 500㎖ 용량만 30원 인상한다.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상반기 맥주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서민식품 라면도 인플레이션을 피해가진 못했다. 따뜻한 밥 한공기마저 챙기기 어려울 때 찾는 식품이 다름 아닌 라면인데, 이 라면 값마저 올랐다. 오뚜기는 진라면 등 주요 라면 가격을 8월 1일부터 평균 11.9% 인상했다. 지난 2008년 4월 이후 13년 4개월만이다.
구체적으로 진라면(순한맛·매운맛)은 684원에서 770원으로 12.6%, 스낵면은 606원에서 676원으로 11.6%, 육개장(용기면)이 838원에서 911원으로 8.7%씩 각각 인상된다. 뒤이어 농심의 신라면 가격은 676원에서 736원으로 7.6% 인상했다. 농심은 2016년 12월 이후 4년 8개월만에 가격을 올렸다. 삼양식품은 삼양라면 등 13개 제품 가격을 평균 6.9% 올렸다.
팔도의 라면 가격도 평균 7.8% 인상됐다. 밀가루, 팜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에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 비슷하게 수급 불균형 이슈가 있는 대두유 가격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밀가루와 대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치솟을 경우 이를 사용해 만드는 제품군 가격이 줄인상 될 수 있다. 과자가 대표적이다. 이미 해태제과는 지난 8월 1일부터 홈런볼, 맛동산 등 주요 5개 제품군 가격을 평균 10.8% 인상키로 했다. 각종 원부자재 가격 급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서다. 롯데제과도 9월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 및 중량 축소를 시행키로 했다. 인상되는 제품은 총 11종이다. 인상 폭은 중량당 가격 기준으로 평균 12.2% 수준이다.
한국인의 국민 음료인 커피 가격도 인상될 조짐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커피 원두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이상 기후로 인한 흉작 때문이다. 세계 커피 원두의 40%는 브라질에서 생산되는데, 올해 내내 가뭄과 한파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다. 케빈 존슨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플레이션 환경에 발맞춰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외식 물가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외식 물가지수는 115.10(2015년=100)으로 1년 전보다 3.2% 상승해 2018년 11월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품목별로는 생선회(이하 외식 가격)가 8.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죽(7.6%), 막걸리(7.4%), 갈비탕(6.5%) 등이 뒤를 이었다. 김밥 가격은 4.8%, 밖에서 사 먹는 라면 가격도 3.9% 올랐다.
여름 폭염과 가을장마로 인한 농산물 가격도 불안정하다.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됐지만, 김장 재료 가격이 오르고 있다. 특히 주재료 배추의 가격이 대폭 올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배추 중품 10㎏ 도매가는 1만600원 수준이다. 1년 전 가격 5500원의 약 2배다.
이런 물가 상승세는 통계로도 잘 드러난다. 10월 소비자물가는 3.2% 뛰었다. 2012년 2월 이후 9년 8개월 만에 첫 3%대로, 9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약 0.67%포인트 정도 물가가 더 올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저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지난달 물가는 2.5~2.6%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2%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2.3% △5월 2.6% △6월 2.4% △7월 2.6% △8월 2.6% △9월 2.5%에 이어 10월까지 7개월째다.
◇ 물가 잡기 위해 제로금리도 포기
위드코로나로 인한 민간소비 증가, 내수 진작책에 따른 물가 상승 요인 등을 고려하면 올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10월 누계 상승률은 2.2%로, 이미 2%를 넘어섰다.
특히 11월 기대인플레이션은 2018년 8월(2.7%) 이후 최고치로 상승 폭은 2017년 1월(0.3%포인트)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은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망을 말한다. 1~2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에 전가될 수 있는 10월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전년동월비 각각 35.8%, 8.9% 올라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통계가 인플레이션을 지목하고 있다.
이처럼 생활 물가가 춤을 추는 이유는 공급망 차질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분업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사슬이 각국의 다양한 사정 때문에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런 공급망 붕괴는 상품의 가장 기초적인 재료인 원자재부터 수급이 불안정하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과 신흥국이 코로나19 충격으로 생산을 못하면서 공급망 교란으로도 이어졌다. 물류 시스템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억눌려 있던 소비가 폭발하면서 올해 물동량이 급증했다. 컨테이너 해상운임은 치솟았고, 항만 정체가 극심해졌고, 화물 트럭은 부족한 상태다. 이는 당분간 해소되긴커녕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언제든 공급망을 다시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여러 면에서 우리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 당장 인플레이션율만큼 화폐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같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그전보다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 그 결과,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코로나19 위기를 이유로 올해 연봉이 동결된 직장인이 상당히 많은 가운데, 이 같은 급격한 물가 상승은 가계 경제에 타격이 크다.
물론 정부도 물가 관리에 적극 나섰다. 한국은행이 지난 8월에 이어 11월에 또 다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카드를 꺼낸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수요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은 금리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공급망 병목 현상 등은 내년 하반기에나 풀릴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잡히지 않는 물가 때문이다. 최근 물가 오름세는 목표 수준(2%)의 물가 관리가 최우선 과제인 중앙은행에 기준금리 인상의 뚜렷한 명분을 제공한 셈이다.

그나마 이런 장바구니 물가는 불평을 쏟아서라도 지갑을 열면 살 수 있다. 그런데 삶에 제일 중요한 집은 그렇게 해서 살 수 없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올해 껑충 뛰어오르면서 상위 20%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5억원을 돌파했다. 15억원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주택가격 기준선이다. 15억원이란 현금이 없이는 수도권 10집 중 2집은 살 수 없다는 설명이다.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10월 수도권 5분위(상위 20%) 아파트값 평균은 15억307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수도권 상위 20% 아파트값은 7억2133만원으로 4년 반 만에 108% 오른 것이다. 2019년 8월(10억297만원) 10억원을 돌파했는데, 2년 2개월 사이에 5억원이 더 뛰었다. 1년 전인 작년 10월(12억 2754만원)과 비교해도 2억7553만원 올랐다. 지난 10월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값은 23억 673만원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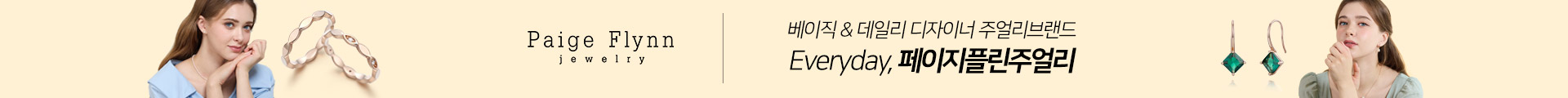
![logo-2[1]](https://cocooni.ai-wp.kr/wp-content/uploads/2025/02/logo-21.png)

![SSF샵-로고[1]](https://cocooni.ai-wp.kr/wp-content/uploads/2025/01/SSF샵-로고1.png)
![르돔아카이브350-390c[2]](https://cocooni.ai-wp.kr/wp-content/uploads/2025/01/르돔아카이브350-390c2.jpg)
![VIIMSTUDIOFashion20141230[1]](https://cocooni.ai-wp.kr/wp-content/uploads/2025/01/VIIMSTUDIOFashion201412301.jpg)
![네이버포스트[1]](https://cocooni.ai-wp.kr/wp-content/uploads/2025/01/네이버포스트1.jpg)
